돈보다 큰 생명의 가치를 찾는 이병철의 백수 인생
대학시절 눈뜬 사회적 의식과 학생운동
고향 마암면 두호리에서 시작한 우리밀 살리기
생태가치와 자립하는 삶에 주목한 천생 농사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5일 입력 : 2024년 01월 05일
|
 |
|
| ↑↑ 이병철 생태귀농학교장, 시인 |
| ⓒ 고성신문 |
|
|
 |
|
| ↑↑ 생태시인이기도 한 이병철 씨는 토종밀 재배는 물론 토종종자 살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
| ⓒ 고성신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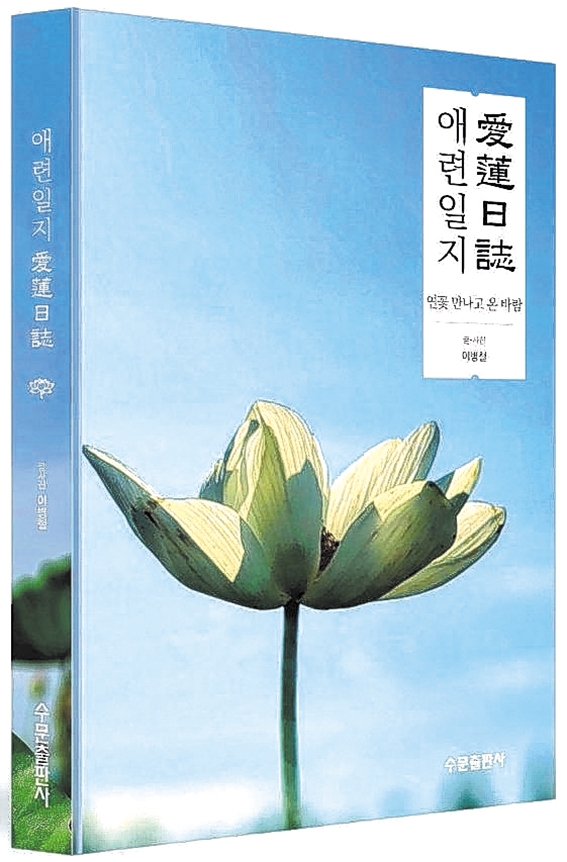 |
|
| ↑↑ 이병철 씨의 사진산문집 ‘애련일지’ |
| ⓒ 고성신문 |
|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백수’라고 본인을 소개한다. 소개말 치고는 참 희한하다. 시인이자 생태귀농학교장인 이병철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병철 씨는 고성 마암면 두호리가 고향이다. 어린 시절, 다들 없이 살던 때 밀사리의 구수한 기억은 참 오래 갔다.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를 따라 통영으로 나가 살던 시절에도 두호리의 기억은 늘 구수하게 따라다녔다.
소년 시절 이병철은 심훈의 ‘상록수’를 읽으면서 언젠가 박동혁 같은 농민운동가가 되리라 생각했다. 가난한 살림에 학업도 포기하려 했던 시절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닌 학교는 그에게 사회적 의식을 키웠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눈뜨게 했다.
젊은 이병철은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늘 고민했다. 돈보다 가치 있는 일, 바로 땅을 일구는 일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고향 고성으로 돌아온 것도 그래서였다.
“돈 버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생산성에 밀려 토종 농작물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시기였어요. 우리 씨앗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에서 나고 자란 제가 농사를 짓고 농업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농사는 돈은 되지 않았지만 평생의 업이 됐다. 고향 두호리에서 농민운동을 하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벗을 만났다. 두호리에서 협동조합과 가톨릭농민회를 만들었다. 경남지역의 초대회장도 하고 전국본부에서 실무자로, 사무국장도 했다.
“농민문제가 해결되려면 물론 농업이 돈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돼야할 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땅을 일군다는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어찌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까. 땅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착취하고 학대하면 우리는 행복한 농작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생명가치에 눈길을 돌리면서부터는 생명운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 수입밀은 사고가 많았다. 1984년 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밀의 경작기반은 무너지고 말았다. 농민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1987년 경남 한살림은 합천과 고성에서 토종밀 재배를 시작했고 198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밀살리기운동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농사꾼 이병철이 있었다.
토종종자를 되살리고 지키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고향마을에서 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을 설득해 밀 종자를 심었다. 우리 땅에 가장 알맞은 종자를 심으면 땅도 땅 위의 생명도 건강해질 터였다.
지금도 마암면은 토종종자를 지키고 되살리려는 농민들의 성지나 다름없다. 그렇게 되살려낸 토종종자들은 건강한 식재료가 돼 ‘한살림’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을 만난다. 이병철이 주목한 ‘생태가치와 자립하는 삶’를 담고 말이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살림, 환경연합, 녹색연합, 녹색대학, 생명평화결사, 생태산촌, 전국귀농귀촌운동 본부장, 녹색연합 대표, 녹색대학 상임이사 등의 일을 해온 이병철의 이름 앞에는 생태귀농학교장과 함께 시인이라는 타이틀도 붙어있다.
수십 년 ‘돈 안 되는 일’을 해온 그는 생태시인으로서, 생태시집을 냈으며 시집 ‘신령한 짐승을 위하여’로 제8회 녹색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귀농인들과 함께하는 생태귀농학교를 만들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생태농업, 환경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자기멸종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은 중앙에 대한 변방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선 삶의 현장이자 터전이에요. 그렇다면 내 고장을 바꾸는 일은 곧 세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둥지를 마련하는 것이 곧 이 멸절의 문명 너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11월 고성에서 열린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세미나에 특강을 위해 고향을 찾았다. 지역언론도 농업도 지방도시도 사실은 변방이 아니라 내 삶의 중앙이라 생각하면 매한가지라 강조했다.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이 평화롭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있어요. 생태농업, 생명가치 존중은 결국 사랑입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존재를 사랑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갑진년 올 한 해 신비로운 청룡의 기운을 받아 고성군민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의 호는 여류(如流)이다.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흐름. 이병철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자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