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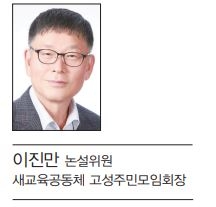 |
 |
|
| ⓒ 고성신문 |
“양두구육(羊頭狗肉)”.
요즘 한창 화두가 되는 사자성어이다.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 ��서 한 말이다. 선거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서운함과, 감언이설로 표를 얻고는 당선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기 위해 끄집어낸 문장이다.
그러기에 비유적인 언어 표현보다는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갈등 해소라는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던진 화두는 말꼬리잡기 놀이로 변질하여 버렸다. 대통령과 ‘윤핵관’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야단이다. 하긴 그렇기도 하다. 아무리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개고기에 비유한 것은 천박하다고 할 것이다. 적어도 사자나 호랑이 정도로 격을 높여 ‘양두사육(羊頭獅肉)’이나 ‘양두호육(羊頭虎肉)’이라고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몇 년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어났을 때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추 장관의 아들이 군 생활 중에 ‘어머니 찬스’를 썼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했다가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사과를 요구당했다.
이 사건 역시 병역 특혜라는 본질은 없어지고, ‘소설 쓰다’라는 문장을 두고 이전투구로 변질하여 버렸다. 하긴 추 장관도 잘못하기는 했다. 다 같은 글인데 왜 ‘소설’만 언급했을까? ‘글 쓰시네’라고 했으면 한국의 모든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일기를 쓰는 코흘리개 아이들까지 들고일어났을 것인데, 소설가에게만 항의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낱말 하나 혹은 문장 한 줄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매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매듭도 없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갔다. 하긴 그럴 만도 하다. 국가의 흥망이 걸린 대사도 아니고, 국민의 삶을 흔들만한 사안도 아닌, 정치꾼들의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도 그렇다. 지금이야 며칠째 대단한 시빗거리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낱말의 용도 하나로 일어난 사소한 싸움이기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의미 없는 말싸움에 휩쓸리고 싶은 마음도 없을뿐더러,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능력도 없어 시비를 가려줄 상황도 아니다. 다만, ‘국어’를 배우고 가르친 교육자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사건에 인용된 문장의 쓰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은 이야기하고 싶다.
국어의 문장론에서 보면 두 사람이 사용한 관용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중에 맞추어 적절하게 쓰인 문장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의 속뜻은 ‘남을 속인 것’이라는 것이지, 비유 대상이 어떤 동물이든 관계가 없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말도 ‘거짓 이야기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지 소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두구육’은 ‘겉은 훌륭하나 속은 변변치 못하거나, 그럴듯한 물건을 전시해 놓고 실제로는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소설 쓰다’는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로, 어학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관용어이다.
두 사람이 사용한 관용어가 상황에 어울리는 적당한 비유였는지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문장에 들어 있는 낱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추미애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한 소설가 단체가, 말하는 이의 의도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전에도 수없이 써왔고, 일상생활에서는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유머처럼 듣는 이를 웃음 짓게 만드는 관용어가 정치권에서만 유독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달을 보라고 하늘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는 정치인들의 나쁜 시력 탓이다. 손가락은 시선을 달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다. 하늘로 눈을 돌리는 순간 손가락은 잊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시선이 손가락에 머물러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문장 하나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여의도의 정치꾼이나, 정치가들이 벌여놓은 싸움판에 끼어든 소설가들은 ‘비유법이 가진 마술’을 무시하고 언어의 사전적 해석에만 치중하는 오류에 빠져 버렸다.
정치판 돌아가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말꼬리 잡기라는 유치한 게임으로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다. 적군과 아군 구분 없이 서로 물어뜯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니 물정 모르는 국민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기 힘들다. 정치꾼들이 벌여놓은 우스꽝스러운 싸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죄 없는 고사성어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오해 없이 잘 쓰고 있는 말이 정치판에 가면 변질한다.
논란이 된 ‘양두구육’이나 ‘소설 쓰다’나, 모두 정치판에서 문장 본래의 뜻이 왜곡되어 버렸다. 여의도 문법이 일반 문법과 다르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다. 비유법의 개념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2차원의 사전을 가지고 뜻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정잡배도 아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질은 보지 못하고 문장 하나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화장은 예술’이라고 했다. 민얼굴을 보다가 화장한 얼굴을 대하면 같은 사람인데도 새롭게 보인다. 마찬가지로 비유는 문장의 화장법이다.
비유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일상어를 예술로 재창조한다. 그러기에 그냥 문장 기교일 뿐, ‘황제 복무’ 논쟁에서 ‘소설’을 쓰는 소설가도 없고, 선거에서 ‘개고기’를 파는 일도 없다. 문장에 쓰인 낱말 하나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비유를 모르는 세상은 예술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다. 비유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여유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일상생활이든, 정치판이든 비유가 주는 문법적 해석과 깊이는 같다.
심지어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처럼 이해 충돌이 가장 심한 전쟁 중에도 비유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억지 논리로 상대방의 말꼬투리 잡는 일은 그만두자. 달을 두고 손가락만 보는 근시안은 버리자. 잘못된 사전적 해석에 매달려 상대를 헐뜯는 정치는 국민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