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으로 코로나19 이겨요] 바람을 가르는 화살이 코로나19에도 명중하기를!
신체 단련 정신수양의 전통무예 궁도
근력과 집중력, 예의 동시에 익혀
철성정 53명 사우들 전국 최상위 활약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5일 입력 : 2020년 09월 15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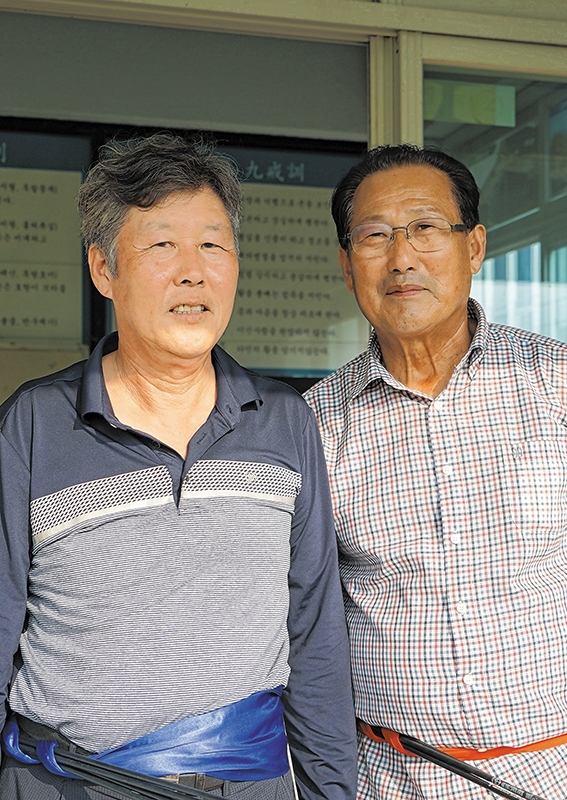 |
|
| ↑↑ 최영진 사범(왼쪽)과 강종배 사두 |
| ⓒ 고성신문 |
|
|
 |
|
| ↑↑ 고성군내 유일한 활터인 철성정에서 궁도협회장기 대회를 마친 사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
|
 |
|
| ↑↑ 코로나19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철성정 사우들은 꾸준히 호연지기를 갈고 닦는다. |
| ⓒ 고성신문 |
|
유독 우리나라 양궁 선수 중에는 ‘신궁’들이 많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마다 한국선수들은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금메달을 놓친 적이 거의 없다. 한국팀이 금메달을 놓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해외 언론에는 토픽이 되곤 한다. 한국팀 선수 중 한둘은 꼭 과녁 가운데 렌즈를 깨뜨리곤 한다. 도대체 한국 양궁은 왜 그렇게 강한 건지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기 짝이 없나 보다. 대궁의 후예라서인가.
중국은 우리 민족을 동이(東夷)라 불렀다. 글자의 뜻만 풀이하자면 ‘동쪽의 오랑캐’라지만 글자 모양을 곰곰 살펴보면 ‘이’자는 큰 大(대) 부수에 활 弓(궁)이 올라가 있다. 큰 활을 잘 쏘는 대궁이라는 뜻으로 우리를 동이족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선 초기 한반도에 총이 보급되기 전 활은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제자리에 서서도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활은 ‘궁술’로, 병사들은 물론 민중에게도 가장 흔히 보급된 무예였다.
양궁은 국궁과 구별하기 위해 붙은 이름이다. 지중해형에서 유래하고 발전해 서양에서 전해진 양궁과 국궁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활시위를 당기는 방식 다시 말해 사법은 얼핏 보기에는 엇비슷해도 전혀 다르다. 양궁은 검지와 중지, 무명지로 당기지만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인 국궁은 몽골리안 사법인 엄지손가락을 쓴다. 활을 잡는 손도 양궁은 검지와 엄지로 활대를 받치는 형태지만 국궁은 흘림줌으로 활체를 꼭 쥐는 모양이다.
고성에서도 궁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고성의 옛이름을 딴 ‘철성정’이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옆 너른 터에 궁사들이 모인다.
“궁도는 호연지기의 무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정신력이 담긴 무예이자 계급과 상관없이 누구든 심신을 단련했던 무예지요. 특권계층만 즐긴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법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흔히 궁도라 하면 나이든 사람들이 조용히 즐기는 전통무예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사실 궁도는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다.
다리는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든든하게 상체를 받쳐야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 허리를 쭉 펴고, 활을 잡은 쪽이나 시위를 당기는 쪽 모두 팔을 쭉쭉 늘려야 한다. 적당히 힘을 주고 빼는 기술도 필요하다. 활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호흡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손색이 없다.
궁도의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집중력이다. 새끼손가락보다 가느다란 화살을 145m나 떨어진 과녁에 맞혀야 한다. 바람이라도 불면 방향도 잘 따져봐야 하니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바람이 잦아드는 적절한 순간을 잘 잡아 순간적으로 대범하게 판단해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놓아야 한다. 철저한 계산과 집중력이 없으면 화살은 반도 못가 툭 떨어진다. 마음이 동요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궁도는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궁도는 대단한 근력이 필요하거나 호흡, 지구력을 요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하다 보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이에요. 무거운 장비를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여성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철성정에는 53명의 사우들이 수시로 찾아 연습하고 있다. 4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이 중 10명 정도는 여성사우들이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국대회에서도 상위권을 휩쓰는 실력자들이다.
옛날에는 짐승의 뿔과 소힘줄, 참나무, 대나무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각궁을 썼지만 요즘은 화학소재의 개량궁을 쓴다. 화살 역시 유엽전이라 불린 죽시를 썼지만 지금은 카본시가 많이 보급됐다. 정규대회에서는 상하의 모두 흰색에 운동화도 흰색을 착용한다.
궁도에서는 활을 쏘는 자세와 동작을 여덟 단계로 구분해 ‘사법팔절’이라 부른다. 발디딤과 화살점검, 살먹이기, 들어올리기, 밀며 당기기, 만작, 이시, 잔신까지 모두 8단계의 동작은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궁도는 신체적 운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신수양의 방법이기도 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전통무예이기도 합니다. 단정히 복장을 갖추고, 사정 내 어른들게 인사를 올리는 것부터가 궁도의 시작이지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우들간의 존중과 예의입니다.”
궁도에서 지켜야 할 예의 아홉 가지를 일컬어 궁도구계훈이라 한다. 몸을 바르게 함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정심정기(正心正己), 어짐과 사랑으로 덕스러운 행실을 행해야 한다는 인애덕행(仁愛德行), 정성스럽고 참되고 실속 있게 남에게 나를 낮추어 순하게 대한다는 성실겸손(誠實謙遜), 자신의 품의를 소중하게 하고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킨다는 자중절조(自重節操), 곧고 청렴하며 용감하고 결단성을 강하게 가지는 염직과감(廉直果敢), 예를 차리는 절차와 몸가짐을 엄하게 지키는 예의엄수(禮儀嚴守), 활 쏠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습사무언(習射無言),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원승자(不怨勝者), 남의 활을 당기지 말라는 막만타궁(莫灣他弓)이 그 아홉 계훈이다.
철성정 활마당에는 ‘금천시일(金千矢一)’이라는 문구가 새겨져있다. 귀하디 귀한 천금과 화살 한 촉이 같다. 어찌 안 그럴까. 금이야 펑펑 써버리면 그만인 재물이지만 화살 한 촉은 사람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다.
사대에 오르면 가장 연장자나 높은 사람부터 왼쪽에서 순서대로 서서 쏜다. 습사무언이라는 계훈처럼 활을 쏠 때는 궁사가 자신이든 남이든 잡담은 엄금이다. 정신을 집중하는 것에 방해하는 일은 예의에 어긋난다. 궁사들은 자기 순서가 끝났다고 냉큼 사대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모두 다 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퇴장하고, 화살을 주울 때는 함께 주우러 가며, 누구든 함부로 사대 앞을 막 돌아다니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1922년 서울 황학정에서 조선궁술연구회가 창립됐다. 해방 후에는 조선궁도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48년 대한궁도협회로 개칭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55년 수도여고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석봉근이 궁도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에도 궁도는 노년층에서 수양삼아 놀이삼아 즐기던 종목이었다. 석봉근은 젊은 층에도 궁도를 보급하고자 노력했다. 1983년에는 대한양궁협회가 분리돼 궁도협회에서는 전통궁도대회만 개최하고 있다.
“궁도가 노인들의 소일거리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우들도 인식변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젊은 사우들이 더 들어와주면 좋겠습니다. 철성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우들도 많은 편이에요. 생활스포츠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활터가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우들의 염원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다듬은 전통무예 궁도가 고성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우뚝 서게 말이죠. 화살이 바람을 가르고 시원하게 날아가 과녁에 꽂히듯 코로나19도 시원하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