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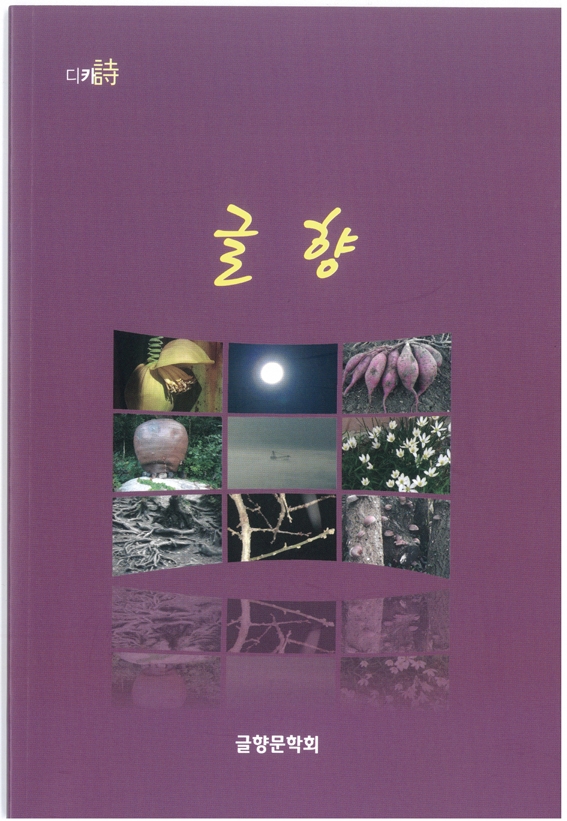 |
|
| ⓒ (주)고성신문사 |
|
|
 |
|
| ⓒ (주)고성신문사 |
| 하얀 화면을 띄워놓고 수천수만의 단어 중 어느 것을 머리로 삼아야 눈길을 끌지, 꼬리까지 속 시원히 이어질지 늘 고민하고 다듬고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다 좌절하고 금세 일어나 다시 끄적거리고,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의 일상이다.
삶의 허리께를 지나고 보면 누구든 헛헛한 마음도 들고, 가슴 속엔 20대 시절 못지않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데 뱉어놓을 재간이 없어 답답하기도 하다. 가지 끝에 매달린 이파리가 달랑거리고, 흰 눈이 춤을 추고, 막 세상을 향해 걸음을 시작한 아이의 사진은 찍어뒀는데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글을 더했다.
밭에 웅크리고 앉아 종일 고구마를 캐다가, 산책길에 늘어선 옹기의 대열을 마주하고, 바람에 산들거리는 여린 꽃잎을 보면서 그녀들은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또한 순간을 글로 남겨둔다. 그게 바로 최근 몇 년 사이 놀랄 정도로 성장한 디카시이며, 엄연한 문학의 한 갈래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고, 숨 쉬는 일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디카시의 정신이다.
김민지, 백경희, 백순금, 손수남, 이명선, 정이향, 제민숙, 제정례, 황보정순. 모두 아홉 명의 문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 흔하디흔한 일상을 뷰파인더에 담고, 그 순간 가슴을 스치는 찰나의 감성을 기록했다.
그녀들은 몰래 휠체어에 올라 앉아 앞발을 늘어뜨리고 망중한을 즐기는 길고양이의 나른한 모습을 발연기로 표현하고, 고목 끝에 송골송골 맺힌 버섯을 두고 초코파이라고 표현한다. 땡볕을 못 버티고 말라버린 풍뎅이 한 마리도, 너무 흔한 풍경이라 글감이 못될 것 같은 들꽃도 그녀들의 짧은 글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디카시는 10여년쯤 전, 고성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문학 장르다. 매체가 다양해지고, 손에는 세 살 먹은 아이부터 백 살 먹은 할매 할배까지 누구나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문학도 시대의 흐름 따라 달라져서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 찍고, 그 순간의 감성을 사진에 입히는 디카시는 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글향문학회원들은 어쩌면 그 선구자인 것이다.
그녀들의 글에는 향기가 있다. 삶의 궤적을 지나며 짙게 밴 땀 냄새이기도 하고, 농염한 여인의 분 냄새이기도 하고, 그립다는 말로는 부족한 어머니의 냄새이기도 하다. 그 모든 삶의 향기를 글향, 이 한 권에 담았다. |